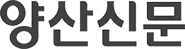30대 후반의 일이다. 그때 내게는 초등학교 1학년인 딸아이가 있었다.
어느 날, 가까이 지내던 친구가 시골로 이주하겠다고 했다. 그것도 서울서 먼 지리산 근방 산속 마을이었다. 곧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될 자식을 학교 공부에 시달리게 하고 싶지 않다는 게 이유였다. 그의 말대로라면 반 아이들과 사이좋게 놀고, 자연을 접하며 성장할 기회를 자식에게 주고 싶다는 것이었다.
지방에서 서울로 갓 올라와 교편을 잡은 나로서는 멀쩡한 직장을 버리고, 자식을 위해 낯선 시골로 내려간다는 그의 말이 듣기에 조금 불편했다. 어디 가든 경쟁이란 있고, 오히려 자식을 세상에 뒤처지게 하는, 나중에 자식으로부터 원망 듣는 일이 될지도 모른다며 나는 그의 결정을 만류했다.
그러나 그는 직장을 버리고, 아내와 자식과 함께 결국 서울을 떴다. 그 후, 나는 그의 좀은 과격한 듯한 결행을 속으로 비난했다. 그러면서 한녘 나를 탓했다. '나는 왜 그런 고민도 못해 보고 딸아이를 학교에 보냈을까.'
같은 나이인데도 나는 왜 자식의 인생을 염려해 보지 못했을까. 나는 왜 사는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런 고민을 해 보지 못했을까.
그때 느낀 것이 있었다. 부모가 되기 위해선 부모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어떻게 부모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아무 준비도 없이 나는 결혼했다. 그리고 생각 없이 아이를 낳았다.
다행히 고향이 시골이라 시골에서 태어났고, 내세울 것 하나 없는 무지렁이 농사꾼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살아온 것이 부모 공부라면 나의 부모 공부의 전부였다. 그 덕분에 내가 낳은 자식은 아무 탈 없이 나를 닮아주었다. 아니 나를 닮은 것이 아니고, 선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신 부모님을 닮았다는 말이 옳겠다. 그때는 몰랐지만 그것은 내가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밑천이었다.
지난 18일, 서울 모 초등학교 어린 여교사의 죽음은 세상을 울게 만들었다. 여름방학을 하루 앞두고 다른 곳도 아닌 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학교와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비뚤어진 세상에 분노를 터뜨린 게 아닌가 싶다.
어느 어느 초등학교에서는 학생이 제 담임선생님을 향해 욕설을 퍼붓고 폭행하여 갈비뼈를 부러뜨렸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심심찮게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중 어느 초등학교 교사는 학부모의 민원이 두려워 학생에게 맞고도 침묵했다고 한다.
학교 바깥세상도 거칠어지기는 마찬가지다. 어른들의 사고는 어른들의 사고라 치더라도 이제는 어린 학생들마저 다른 곳도 아닌 자신의 교실에서, 다른 이도 아닌 자신의 담임선생님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있다. 이 일에 학부모까지 민원이라는 무기를 들고 가세한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떠오르는 이가 있다. 지리산 속으로 이주해간 나의 친구다. 현실성 없는 말 같지만 부모 되는 공부를 먼저 한 뒤 결혼해야 한다. 교사의 교권보다 우선인 것은 자식의 진정한 행복을 생각할 줄 아는 이 세상 부모들의 적극적인 고민이다.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라거나 학생이 선생님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는 일은 그냥 나오는 말과 행동이 아니다. 그 부모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을 그대로 물려받아 쓰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