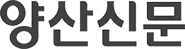경상남도 양산시 덕계로 65


봄이 찾아 왔는데도 아직 바람이 차다. 비는 날라고 해가 보였다 말았다를 반복하는 날이다. 큰 아이를 레슨 시간에 맞춰 학원에 바려다 주고 잠깐의 짬을 내어 핸들을 돌렸다. 가까운 마트에 차를 주차하고 동네를 구경하기 시작했다. 오랜만이다. 덕계동은 가까운 동네지만 걸어서 다녀본 적은 많지 않았다.
마트 건너편 골목으로 접어들 때 작은 공방에 불이 켜져 있다. 골목에는 가게가 몇 없어서 눈에 더 들어온다.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모양이다.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있다. 공방 안쪽으로 작은 재봉틀이 하나 보인다.
쇼윈도는 누군가의 손으로 예쁘게 만들어진 물품들이 가지런히 자리 잡고 있다.
오랜만에 보는 재봉틀이다. 내가 어릴 때 엄마는 집에서 재봉질을 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통영에 살았는데 누비는 통영을 대표하는 상품이라 나의 엄마처럼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작은방 한편에는 엄마의 재봉틀이 있었다. 엄마는 집에서 온종일 재봉틀 앞에 앉아 최신 음악을 들어가며 발을 쉴새 없이 페달을 눌렀다.
집은 시끄러운 재봉틀 소리와 음악 소리로 가득 찼고 나는 엄마가 발을 멈출 때 간간이 들려오는 노래를 엄마와 함께 따라 부르곤 했다. 엄마의 재봉질 소리는 일정한 간격으로 돌아간다.
비단에 얇은 솜을 대고 무한한 네모 모양으로 박음질을 한다. 나는 엄마의 재봉틀 옆에 딱 붙어 서서 엄마의 발을 따라 움직이는 바늘에 집중했다. 엄마는 그럴 때면 먼지 난다며 저쪽으로 가라고 했다. 엄마는 먼지를 마실까 봐, 바늘에 다칠까 봐 재봉틀 근처에 못 가게 했었다. 우리 집은 늘 시끄러웠고 먼지가 날렸으며 재봉틀에서 나는 기름 냄새가 가득했다.
엄마는 주문받은 물건을 만들고 남은 천으로 집에서 우리 가족이 쓸 베개 커버나 이불 커버를 만들었다. 자투리 천으로 만들다 보니 조금은 촌스럽고 조합이 어색했다. 그때 엄마가 만들었던 이불 커버는 아직 우리 집 이불장에 가지런히 놓여있다.
엄마는 그것을 볼 때면 "이걸 아직도 갖고 있나. 오래돼서 못 쓴다. 버리라."
하지만 나는 그때마다 "싫다."라고 한다.
나는 오래된 커버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누비 커버를 볼 때면 어릴 적 방 안의 공기가 생각나고, 엄마와 함께 들었던 노래가 생각난다.
그 시절 엄마를 느낄 수 있는 몇 안 되는 물건이다. 언젠가 엄마가 멀리 떠나고 내가 떠나도 버려지지 않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