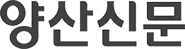문장을, 문학을, 나아가 기사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단 한 구절로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누군가 정의를 내린다면, 우리가 해야할 일은 '끝없이 의심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장을 사랑하는 사람은 문장의 행간 속에 숨어산다. 행간은 끝없는 괄호이며 압도적인 정적이다.
이 정적 속에서 흰 발판을 밟는다. 누군가 바다에 흘려보낸 유리병에 갇힌 채 끝없이 병의 표면을 두드린다. 그리하여 문인은 괄호 속에 갇힌 귀신이 된다.
그러나 활자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은 소통하기 위해 존재한다. 독자가 없는 글은 없다. 혼잣말 하지 않기. 우리가 지켜야 할 사명이다. 그러므로 쓰는 이는 '읽히는 글'을 만들어야 한다. 스스로가 대단한 글쓴이라 생각해본 적은 없지만, 세워둔 모래성 정도는 있다.
첫 번째, 건축물의 설계도를 세울 것. 건축가 중, 건물의 겉모습만 보고 "와, 멋지다"하고 그냥 지나치는 이는 없을 것이다. 글을 쓰고자 하는 이는 외부와 내부를 빼곡히 메울 자재를 생각해야 한다. 어떤 자재로 쌓고, 어떻게 굳혀야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건물이 될까?
건물의 디자인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다. 잘 읽히지만 다채로운 빛깔을 내포한 아름다운 구조물을 설치할 것. 이 간략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유(思惟)가 필요하다. 모든 사유는 무너지고, 흐트러지기 마련이지만 모래성은 무너지기 위해 태어났다.
두 번째, 리듬. 문장에는 농도가 있다. 어떤 문장은 수심 10m의 깊이로, 어떤 것은 100m의 깊이로 존재한다. 한데, 이 두 문장을 같은 장소에, 같은 높낮이로 배열한다면 그저 삐뚤빼뚤한 두 개의 레고 장난감으로 버려질 수밖에 없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농도를 읽는 눈이 필요하다. 그리고 리듬을 생각한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사물에는 리듬이 있다. 혼이 없던 사물에서 파도를 만드는 것. 그리하여 정적 속에 파장이 일게 하는 것. 정물 속에 숨어있던 단 하나의 목소리를 찾는다. 그것이 리듬이다.
마지막은 '모른다'에서 시작하기이다. 세상에서 제일가는 재능은 '모르는 것'이다. 결과물에 대한 '불만족'에서부터 문장의 씨앗이 뿌리를 내린다. 고여있는 물은 썩기 마련이므로 끝없이 모르는 바보가 되기. '바보'만이 총천연색의 빛깔을 볼 수 있으며 형체가 없던 것을 두 손으로 꽉 움켜쥘 수 있다. 바보는 끝없이 궁금해할 줄 앎으로, 낯선 공간에 노크할 수 있다. '궁금해하다'의 줄임말은 '사랑'이므로.
무언가를 사랑할 대상이 필요한 양산 시민 누군가에게, 세상에 있는 모든 낱말들을 종이학처럼 접어서, 얼마나 언제고의 시간이 걸릴지라도 나의 목소리가 전해지기를 바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