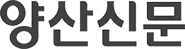순간,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 그때 내 나이 겨우 여섯 살이다. 분명히 외할머니 목소리다. “작은 종아, 이리 왔다 가거라”라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외갓집 사립문과 반대 방향인 왼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들은 척도 않고 그대로 멀찌가니 비켜 지나쳤다. 아직도 그때처럼 크게 들린 내 발소리와 자꾸만 되감기는 걸음을 알지 못한다. 눈이 침침한 외할머니 둘레를 벗어나는 스무남은 걸음은 솜병아리 같았다.
고개 너머 무등골의 송씨 문중 묘제 날이라 떡 얻어오는 길이었다. 우리 마을에도 그 집안의 친구가 있어 어울려 여럿이 갔다. 나보다 세 살 위인 끝순이 누나도 함께 있었다. 못 살던 시절이라 명절과 제삿날 또 마을에 잔치나 장례 같은 큰일 때라야 떡 구경을 할 수 있었다. 늦가을에 묘제 지내러 가는 행렬이 보이면 아이들이 우르르 뒤따라가서 떡을 얻어 먹는다. 묘제는 묘사, 시사라고도 하는데 멀게는 고개 둘을 넘기도 했다.
묘제를 지내는 동안은 아이들끼리 놀거나 구경꾼 노릇을 하다가 제례가 끝나 나눠줄 떡을 썰 때쯤이면 줄을 선다. 몇 번 묘제에 따라가 보면 눈치가 생긴다. 얼핏 분위기를 보면 나눠줄 가짓수와 떡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다. 아기를 업고 가면 두 몫을 주는 인심이었다. 장난꾸러기가 베개에 두디기(포대기의 고장말)를 덮어씌워 줄을 서도 한 몫을 더 주었다. 서로가 시치미를 떼고는 아이들은 돌아오면서 깔깔거리고, 어른들은 아이들 꼬리가 사라지고 재잘대는 소리가 멀어지면 씩 웃는다. 큰일 인심은 거지와 아이들이 낸다는데, 어떤 집안에서는 떡을 반토막 두부처럼 작게 썰어 두고두고 욕을 먹기도 했다. 손바닥 자(尺)로 크기와 두께를 같이 재니, 댈 것도 없는 걸 어째서 모를까. 들길 산길을 한참이나 걸어서 얻은 떡이라 바로 먹는 아이는 거의 없었다. 떡 덩이를 쥐고서 걷다 보면 물러지거나 콩고물이 허옇게 벗겨지기 일쑤다. 군침을 삼키면서도 눈요기만 하고 집에까지 들고 온다. 먼저 어른에게 보이면 손톱만큼 맛보고는 아이들 먹으라고 도로 건네준다.
그때 우리 지역에는 면소재지를 비롯한 서너 마을에 상점이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 아이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었다. 점방 단골은 잘 사는 집 아이다. 못사는 집 아이들은 그들과 어울려 기웃거리나 매번 들러리였다. 어쩌다 맘씨 좋은 동무에게서 조각 과자라도 얻어 먹을 때면 그 얼굴이 어찌 그리 훤해 보이고 하늘이 왜 그리 파랗던지. 고자 종류도 요즘처럼 여러 가지가 아니라 건빵을 비롯한 몇 가지뿐이었다. 아이들이 당당하게 점방에 들어서는 건 고작 서너 달에 한두 번이다. 심부름값이나 학용품 살 돈을 부풀려 마련하는 용돈이니 늘 과자가 고팠다. 사 먹는 종류도 건빵으로 정해져 있다. 요즘 돈으로 100원이면 일곱 개였다. 그런데 점방 주인은 귀신이다. 한 움쿰 쥐어주는 걸 눈으로 세면 언제나 일곱 개였다. 모자라면 적다고 어림없으며, 한두 개 많아도 모른 척 넘어갈 놀부 심보이면서 매번 서운했다.
군것질할 게 볶은 밀이나 콩 뿐일 때이니, 묘사가 있는 날은 아침부터 들뜨기 마련이다. 이 날은 걸음품이 많으며 또래들과 장난질이 잦고 또 묘제에 차린 음식을 보고서 껄떡거려 배가 일찍 고프다. 그래도 떡을 들고서 의기양양하게 찬물을 끼얹듯 외할머니가 모처럼 얻은 내 떡을 빼앗으려 하다니, ‘오늘 내가 떡 얻어 이 길을 지나갈 줄 알고서 기다린 게 틀림없구나’ 이런 생각이 번개처럼 지나갔다. 외할머니 시야에서 벗어났지 싶은 한 집 건너 천순이 집 앞에서 누나가 궁금하여 휙 돌아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외할머니가 누나의 손목을 꼭 붙들고 사립문으로 들어서고 있다. 나를 놓치고서 누나를 끌고 가는 외할머니가 못마땅했으나 내 손에 든 떡을 다시 보며 빼앗겨도 누나의 몫이니 독립채산처럼 나와 무관하다는 잔머리 셈법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집에 다다르니 어머니가 “이제 오냐”면서 내가 손바닥으로 내미는 떡을 보고는 어서 먹으라고 고개를 끄덕거렸다. 나는 외할머니에게 떡을 빼앗긴 누나가 나눠 먹자고 할 것 같아 한입 베어 물었다. 어머니가 빙그레 웃으며 “끝순이는 왜 안 오노? 너거 외할매가 아이 하나를 보내라 한다는데...”하였다. 내가 딴전을 피우고 있는데, 누나가 제법 볼록한 보따리를 들고서 마당에 들어서고 있었다. 누나가 어머니에게 “외할매가 주데”하면서 보따리를 건네는데 깜짝 놀랐다. 없어야 할 묘제 떡이 누나의 다른 손에 쥐어져 있었다. 보따리를 펼치니 찰떡이 한 채, 절편이 우리 식구보다 많은 여남은 개, 조선종이에 말아 싼 지짐이와 생선도 나왔다. 내 입이 벌어지고 눈이 휘둥거레지는데 누나가 “엄마, 외할매가 고구마 지짐이는 모종이 주라 하더라”하는 게 아닌가.
그제야 어린 소견에도 상황이 어렴풋이 잡혔다. 그때 외할머니의 시계(視界)는 1km도 안 되었다. 연가시라고도 하는 사마귀란 놈이 외할머니 눈에 오줌을 싸서 그리 되었다 한다. 병원이 없는 시골이라 그대로 낫기만을 기다렸는데, 그만 악화되어 지팡이를 의지해 잿빛 세계를 헤매는 신세였다. 헤아려보면 어제 제사에 당신의 맏딸이 맨손으로 돌아갔다. 며느리 몰래 제사 음식 중 얼마를 챙겨 두었다. 한동네에 사는 딸네 집이라 얼른 갖다 주고 싶으나, 5분거리가 반 시간도 더 걸리니 할 수 없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부탁하였다. ‘우리 딸네 집에 가서 아이 하나를 보내라 해 주소’라고.
그런데 기다리는 외손은 오지 않고, 일 나간 며느리가 안제 돌아올지 몰라 좀이 쑤셔 마당을 서성거릴 때 아이들 지나가는 소리가 들린다. 그 중에 어눌한 내 목소리도 들리니 ‘옳지 오늘이 묘사가 있는 날이구나 이놈들 돌아올 때 보따리를 안겨 보내야지’하며 우리 둘을 기다린 것이다. 언제부터 살짝 가까이서 뿌연 눈은 허공에 두고 청야(聽野)에 의지해 당나귀 귀로 서 있던 외할머니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