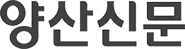|
||
|
박 성
진 | ||
봄비가 하루종일 추적대는 창을 내다 보면서 고별사를 씁니다. 한 신문의 편집을 책임지면서 매주 독자들의 눈초리를 경외로움속에 수렴해 오던 지난 2년간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흘러갑니다. 저에겐 가장 중요한 훈육이 바로 그 독자들의 눈과 입이었습니다. 매일매일을 긴장시키고 방만함을 허용치 않는 독자의 비평이 저의 양식이었던 셈이죠.
지난 수첩을 펼쳐 봅니다. 처음 양산신문의 주필직을 맡고 나서 제일 먼저 썼던 글귀가 보이는군요. 밀착성과 다양성, 그리고 애향심을 촉발하는 구심점이 제가 목표했던 지역신문으로서의 편집방향이었습니다. 지역의 정서를 가장 잘 대변하는 자세가 밀착성이겠지요. 흔들리지 않는 정도(正道), 누구나 말로서 내세우는 신문의 사명이기도 하지요. 다양성은 우리 양산같은 복잡다양한 도시에 사는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방향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야만 다양한 독자층이 확보되고 참여의 폭이 넓어질 것이기 때문에 독자위원의 구성과 함께 각계각층의 기고와 직접참여를 독려해 왔습니다. 실제로 많은 시민들의 다양한 관심사를 접할 수 있었고 그것은 그 자체로 중요한 신문의 구성요소가 되었답니다.
또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지역신문만이 가질 수 있는 향토정신이 되겠지요. 우리 지역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통해 애향심을 키우고 나아가 미래의 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기대를 높여갈 수 있다는 관점은 제게 너무나 많은 명제들을 부여해 주었고 저는 계속해서 그런 뿌리를 내리는 일에 큰 비중을 두어 왔답니다. 주위의 많은 분들이 직접 자료를 주시고, 정보를 알려 주시고, 글을 써 주시는 노력에 정성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지역의 역사적 의미가 작지 않고 대대로 내려온 주민들의 향토사랑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K형,
호사다마(好事多魔)라고 늘 좋은 일에는 궂은 일이 따라다니지요. 제가 처음부터 세워놓고 지키려 했던 목표를 아직 다 못하고 물러나게 된 것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우리는 근대의 역사속에서 민족 언론의 참된 역할과 국민정신을 선도해 온 건전한 비판정신과 정론직필의 견고한 틀을 잘 보아 왔습니다. 하지만 유신정권과 군사독재 시절을 겪으면서 권력에 야합한 언론의 병폐와 역기능 또한 싫지만 볼 수 있었던 게 사실이지요. 저는 언론을 경영하는 일에 아편같은 단맛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것은 너무나 달고 향긋해서 빠져들면 일신을 병들게 한다는 걸 알지만 탐닉하게 만들어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하게 한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권력의 편에 서거나 또는 그렇지 않을 때에도 그 정도를 잘 깨치지 못하여 펜의 힘을 잘못 쓸 수도 있다는 현실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유혹에 빠질 수도 있고 가끔 머리를 흔들며 자신을 돌이켜 보곤 했지요. 사실 저부터 할말없이 부끄러운 일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지역정서를 반영한답시고 균형을 잃은 적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요. 어쩌다 한두번은 아무렇게나 던져놓고 뒤에 숨어서 게으름을 피우기도 했지요.
그렇지만 이 대목에서 가장 하고 싶은 한마디는 역시 신문을 이끌어 가는 중추적인 힘인 경영과 편집, 모두가 시대에 부끄러움이 없는 가치를 견지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문은 보통의 회사나 집단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고도의 도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시민을 계도할 수 있고 여론을 형성해 갈 수 있을 겁니다. 신문의 발행이 어떤 경우에도 이면의 다른 목적을 위한 것이 돼서는 안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관이 확립될 때 양산신문은 시대를 뛰어넘어 영원한 지역신문의 선두주자로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시기에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제가 자리를 물러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평소 저에게 큰 관심을 보내면서 지지하고 격려해 주신 주변의 많은 지인들을 생각하면 부끄럽기 그지 없습니다.
좀 쉬면서 제 자신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천명을 안다는 오십을 훌쩍 넘긴 나이에 또다시 후회와 아쉬움으로 점철된 과거를 떠올린다는 것이 송구하지만 그래도 반성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K형,
언제 또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제는 용기를 잃지 않을까 합니다. 저 하나가 사라진다 해도 신문은 또 발행돼 나오고 사회는 제 바퀴를 잘 굴려 가겠지만 혹시 압니까. 또다시 주제넘은 저의 말 한마디가 양념역할을 하게 될지.
어쨌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박성진 기자
ocarita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