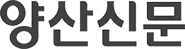시시각각 봄이 다가오고 있다.
봄을 맞기 위해 뜰 안 낙엽을 갈퀴로 그러모은다. 낙엽 더미 속에도 봄은 바쁘다. 작약 새순들이 뾰족뾰족 돋아난다. 동네 어르신들 말로 함박꽃이라고 부르는 이 작약은 꽃 피는 6월을 위해 벌써 잠에서 깨어났다. 발긋발긋한 새순에 물이 올라 통통하다.
수선화가 불현 떠오른다. 봄 한철 잠깐 피고 사라지는 수선화는 자칫 꽃 핀 자리를 잊기 쉽다. 그런 탓에 함부로 밟다가 새 움을 부러뜨린다. 생각난 김에 갈퀴를 들고 찾아갔는데 그들은 나보다 한 걸음 빨랐다. 꽃망울을 물고 부리부리하게 나와 있다.
겨울이 떠난 자리에서 노란 주름 꽃을 피우며 봄을 즐기는 꽃이 수선화다. 그들은 텁텁한 봄기운을 싫어한다. 그보다는 오히려 새파란 냉기를 좋아한다. 가만두어도 개체 수가 늘어나는지 초록빛 수선화 꽃자리가 해마다 늘어난다.
작약이며 수선화보다야 조금 느리지만 새순을 뾰족이 밀어 올리는 것으로 참나리가 있다. 참나리는 고향 집 뒤란에 살던 것들인데 서너 포기 옮겨다 심은 것이 셀 수 없이 많아졌다.
식물들은 우리가 미처 못 느끼는 봄을 미리 알아채고 벌써 깨어난지 오래다. 갈퀴를 들고 함부로 낙엽을 긁어내기엔 때가 늦다.
이웃 수원 집 아저씨로부터 몇 뿌리 얻어 심은 창포는 저들끼리 밀고 밀리며 살아내느라 알뿌리가 흙 바깥으로 불거져 나왔다. 그런데도 얼지 않고 씩씩하게 겨울을 난다. 어떤 녀석들은 지난해 피워 올린 푸른 잎을 그대로 지닌 채 당당히 서 있다.
대개의 식물은 제 몸을 버리고 씨앗으로 혹한을 난다. 그런가 하면 지난가을의 그 모습 그대로 겨울을 견디는 것들도 있다.
그중 하나가 조개나물이다. 양지바른 산언덕에서 흔히 만나는 꿀풀 꽃과 식물이다. 꽃 모양으로만 본다면 자난초와도 유사하다.
어느 봄날, 집 그늘에 낯선 보라 꽃이 피어있었다. 어디서 날아왔는지 번식이 왕성했다.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이름이 조개나물이다. 양지바른 곳을 좋아한댔지만 오히려 그늘을 좋아했고, 호젓한 꽃자리를 좋아한댔지만 오히려 사람의 번잡한 발소리가 들리는 길섶을 좋아했다. 조개나물이 선 자리는 물 조루에 수돗물을 받아 수없이 오가는 길목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발길을 두려워 않고 꽃을 피운다.
좀 안된 말이지만 밟혀도 잘 크는 식물이 조개나물이다. 그래서 그런지 정이 더 간다. 발걸음 옆으로 질경이처럼 끈질기게 자라 질경이처럼 5월이 오면 보라 꽃을 피운다. 나름 강단이 있어 그렇겠다. 잎을 가진 채로 번듯하게 겨울을 난다. 갈퀴 디밀 곳이 없어 나는 갈퀴를 두고 장갑 낀 손으로 낙엽들을 긁어낸다.
대파 심었던 빈 밭에 들어서 본다.
놀랍다. 빈 밭인 줄 알았는데 빈 밭이 아니다. 흙빛을 닮은 개망초가 잎을 부쩍부쩍 늘이고 있다. 이즈음의 풀들은 온통 흙빛이다. 황새냉이도 그렇고 뽀리뱅이며 지칭개도 그렇다. 검스레한 흙빛을 닮았다. 작은 것들이 그렇듯 땅에 납죽 엎드려 겨울바람을 피하며 산다. 그런 까닭에 얼핏 보기에 빈 밭 같아도 가까이 들여다보면 밭은 어린 생명들로 가득하다.
노지에서 겨울을 이겨낸 것들은 작아도 힘이 세다. 나도 봄맞이를 위해 두 팔을 휘두르며 힘을 올려본다. 내일은 백암 장터에 나가 감자씨를 준비해야겠다. 봄은 출발이 어렵지 한번 달려 나가기 시작하면 뒤쫓아가기 버거울 만큼 걸음이 빠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