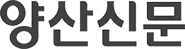누구인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주제에/ 항상 광명을 본다.
님은 바로 나(我)일까./ 님은 바로 各自요/ 님은 바로 自身일세.
그러한데 저 노래소리는/ <漁父之利>올시다 / 남쪽에 자라오른 珊瑚숲과/ 현기증을 얽은 交通網에서/ 파도가 춤을 추는 魚族입니다.
<고래 싸움에 등이/ 터진 새우는 映?였던가요> / <무던히도 할 일이 없나 보군요.
허나 有害食品에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孔子는 탄식한다./ <하필이면 楚나라 사람이라 했는가>/
釋迦는 나에게 말한다./ <信仰에 묶이지 말라>
心臟에서/ 나온 날개는 인사한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전번에 만났던/
때는 어디였던가요> <잘은 모르겠으나/ 매우 추운 날이었어요. 필시 싸구려 선지국집이었을 거예요./ 우린 언제나 공연히 바쁘군요. /글쎄올시다./ 언젠가는 아마 만나겠지요./ 안녕 그럼 안녕> / <그럼 안녕 안녕>
마을은 무슨 이야기를 전하나./ 밝은 빛과 그늘의 對話에서/ 그 무능한 말씀을 留意한다.
-김구용, <頌 百八 -16>전문
이 시는 김구용 시인의 『송 백팔(頌 百八)』(1982년)에 실린 작품 중 16번째다. 김구용 시인은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다닐 때 필자의 은사님이기도 하다. 대학시절 김구용 교수님께 "선생님의 시집을 꼭 읽어보고 싶다."고 떼를 써서 귀한 시집을 직접 받아 지금도 간직하고 있다. 바로 『시(詩)』(1976), 『구곡(九曲)』(1978), 『송 백팔(頌 百八)』(1982) 시집이다. 그때도, 지금도 교수님의 시는 나에게는 여전히 난해해서 몇 번을 읽어도 해석이 어렵다. 대학 1학년 2학기부터였던가? 나는 4학년 졸업 때까지 줄곧 김구용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다. 그의 강의에 매료되어 애제자가 되어 김구용 교수님의 연재 시를 매달 《현대시학》 전봉건 교수님께 직접 전달해 드리는 심부름을 하기도 했다. 시인은 시로 모든 것을 말해야 한다고 하시며, 또 시인을 평할 때 시인은 미워해도 작품을 미워해선 안 된다는 말씀도 하셨다. 또한 나에게도 문단사가 아닌 문학사에 남는 작품을 써야 한다는 말씀을 누누이 해 주셨다. 김구용 교수님은 시는 어렵게 쓰셨지만, 학생들 앞에서는 언제나 웃으며 쉽게 강의했다. "시 참 좋다. 나 같으면 이렇게 못 써"라며 늘 다른 시인의 시를 높이 평가했다.
임우기 문학평론가는 무위이화(無爲而化)의 시 정신을 논하는 데 있어서 빠트릴 수 없는 대시인으로 김구용 시인을 꼽고 있다. "김구용의 시 세계는 유불선이 회통하는 심원한 정신세계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문학계에서는 '난해성의 壁'이라 회자되며 김구용 시의 분석과 해석에서 미답의 영역과 비평적 과제들이 남아있습니다. 김구용의 시는 기법적으로는 서구 상징주의, 초현실주의 시학이나 동양의 한시 선시 전통 등과 통하고 지금의 시점에서도 동서고금의 철학 미학 등을 통해 새로이 조명할 여지가 많습니다."며 많은 비평가들이 김구용의 시는 워낙 난해해서 '난해의 벽'이라 했지만 이 난해의 벽이라는 평가 속에 역설적으로 김구용 시인의 도저한 시 정신이 있다는 것이다. 유불선 회통의 경지에서 무위이화 하는 언어, 그로부터 무애(無碍) 한 언어 세계가 펼쳐진다는 것이며, 김구용 시 정신은 비록 난해의 벽이라 할지라도, 한국 시인이 우러를 시 정신의 표상(表象)이라고 말하고 있다.
늘 꼿꼿한 마음으로 시를 쓰시며, 다른 시인의 시를 칭찬하시던 선생님의 모습이 그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