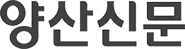지난 5일 절기상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깬다는 경칩(警枕)에 영취산과 천성산, 그리고 대운산 정상에 춘설(春雪)이 내렸다. 비록 소량이긴 하지만 어릴적 눈밭에서 뛰어 놀았던 기억을 떠 올리게 했다.
60년대 중반 막바지 겨울에 지칠줄 모르고 밤새 윙윙 울어대던 문풍지가 울음을 그치고, 아침이면 마당 한가운데 가득 쌓인 눈 위에 족제비와 쥐들이 오간 발자욱이 선명했다. 한가득 눈을 뒤집어 쓴 장독대 뒤 풍성한 사릿대문이 눈의 무개를 견디지 못해 허리가 땅바닥까지 휘어지고, 마당 한켠의 마닥자리에도 눈이 가득쌓이고 들판은 온통 하얀 세상으로 변했다. 이처럼 눈이 많이 내린 날이면, 아침밥을 먹는둥 마는둥 집 뒷산에서 무릎까지 쌓인 눈을 헤치며 토끼 몰이를 하고, 마당 한가운데 바지개(싸리나무나 대나무로 만든 큰 소쿠리 모양)에 아래 쌀을 뿌려 놓고 가르다란 새끼줄을 묶어 바지개 아래 쌀을 쪼아 먹는 참새를 잡았다.
한낮이면, 팔뚝만한 나무 토막에 판자(합판)를 붙혀 만든 스케이트(썰매)를 타던 기억도 있다. 생생 불어대는 차가운 눈 바람도 아랑곳 않고, 신문지나 1년 내내 벽에 걸려 있던 달력 등을 접어 만든 떼기(딱지)치기와 구슬따먹기, 납적한 돌을 발로 차는 지치기 등으로 추위를 즐겼던 기억도 있다.
여자 아이들은 유리 구슬만한 작은 돌맹이 여럿개를 앞에 놓고 그 중 한 개를 집어 높이 던지고 땅바닥에 놓인 돌맹이를 같이 잡아드는 일명 짤래를 하면, 간혹 동네 어르신들께서 가시나(여자 아이)들이 짤래를 많이 하면 가뭄이 든다고 야단을 치기도 했다. 이처럼 하루종일 흙 먼지에 파묻힌 손등에는 떼국물이 앉아 손등이 갈라터지고, 옷 소매는 따닥따닥 코물 딱지가 앉아 반짝반짝 빛이날 정도였지만, 일주일에 한번 정도 소죽을 끊이는 가마솥에 물을 데워 목욕을 했다.
요즘처럼 흔해 빠진 이태리타올 한장 없어 왕겨나 작은 돌맹이로 손등의 떼를 밀때면, 가마니나 볏짚으로 만든 덮섶을 등에 얻은 소들이 뜨거운 콧김을 내쉬며 빤히 처다 보던 모습이 생생하다.
밤이 되면, 후레쉬(푸른색 ㄱ자형 군용)를 들고 친구들과 함께 참새 잡이에 나섰다. 친구 어깨 위에 홍말(목마)를 타고 추위를 피해 초가집 지붕 구멍에 숨어 있는 참새를 잡아 꼼밥을 해먹기도 했다. 당시 초가지붕은 안산(천성산 화엄벌)에서 베어온 억새나 볏짚 또는 껍질을 벗긴 개량대(삼베 옷과 대마초를 만드는 식물)로 지붕을 이었다.
당시 우리 마을에는 약 100여 가구에 달하는 다소 큰 마을이였지만, 대부분이 초가집이고 기와집은 대여섯 가구에 불과해 한겨울이 되면 참새들은 혹독한 추위를 피해 초가지붕이나 가느다란 시릿대 숲에 집을 지었다.그런데 요즘은 참새를 보기가 그리 쉽지 않고, 수백마리가 무리를 지어 씨익씨익 소리를 내며 울타리를 누렇게 물들이던 뱁새(아주 작은 새)도 어디로 갔는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어쩌면 환경오염 탓이 아닐까도 싶다. "날씨가 너무 추워 까마귀가 다 얼어 죽었네"라는 말처럼 찬바람이 가슴팍을 파고 들었지만, 지금 시대처럼 질 좋은 보온 소재의 방한복이나 흔해빠진 패딩잠바, 마스크 한 장 없이 혹독한 겨울을 났지만 그래도 그 시절이 좋았던 것 같다.
지난 2018년 3월 27일과 2023년 2월 10일 겨울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양산시전역에 폭설이 내린 이후, 지난 5일 천태산과 영축산, 천성산, 대운산에 춘설(春雪)이 내렸지만, 옛날처럼 큰 눈이 내리지 않아 어릴적 눈 밭에서 뛰어 놀았던 그 시절이 살짝 그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