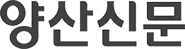그분이 꽃씨 편지를 보내왔다.
하얀 편지 봉투를 여니, 그 안에 관공서에서 쓰는 질기고 얇은 노란 봉투가 또 나오고, 그 안에 눈에 익는 접시꽃 씨앗 십여 개가 들어 있다.
6, 7년 전, 그때 그분으로부터 직접 받아본 그 꽃씨다. 그때 나는 그 접시꽃 씨를 안성 마당가에 심어놓고 여름 한철 그 꽃의 소박한 매력에 젖은 적이 있다. 첫해는 꽃이 피지 않고 그 이듬해부터 꽃이 핀다는 것도 그때 알았다. 꽃씨 봉투를 기울여 손바닥에 꽃씨를 받는다. 흔하다면 흔하고 수수하다면 수수한 꽃씨다. 무엇보다 이걸 주변 사람에게 보낼 줄 아시는 그분 마음이 고맙다. 대수롭지 않아 보이지만 이걸 이렇게 보내는 일이란 그리 쉬운 게 아니다. 그러려면 어느 날 꽃씨를 받고, 햇볕에 말리고, 문방구에 가 봉투를 사고, 주소와 우편번호를 찾아 적고, 일일이 풀을 붙이고, 그걸 모아들고 우체국까지 걸어가든가 버스를 타든가 하는 불편함이 뒤따른다.
그런 수고로움을 다 알고도 꽃씨를 보내신 그분의 정성에 감동한다. 그분의 마음 안에 깃들어 있는 순수한 심성이 아름답다. 연세가 지긋한 그분에게 아직도 소년의 감성이 살아 있다는 게 또한 놀랍다. 우체통도 사라지고, 손으로 쓰는 편지도 다 사라진 요즘 세상에 우편으로 꽃씨를 보내는 마음이라니!
물질이 판을 치고, 순수한 마음이란 게 어리석어 보여 마치 구시대의 유물 취급받는 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다. 이런 시대에 타인에게 꽃씨를 보내는 일은 어찌 보면 너무도 시대에 맞지 않는 헛수고 같다.
대체 이 도시 어디에 꽃씨를 심으라고? 우선 그런 넋두리를 하기 쉽다. 그만치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지엔 꽃씨 하나 심을 자리가 없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꽃씨 하나 심을 마음의 여유조차 다 지우면서 살고 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그런 삭막한 세상에 익숙하다. 그러나 꽃씨 한 알이 자라 피워내는 꽃의 힘을 그분은 믿고 있는지 모르겠다.
한 십여 년 전 일이다. 일본을 다녀온 친구가 그곳 꽃씨 가게에서 샀다며 나팔꽃 씨를 보내왔다. 그때 나는 궁리 끝에 베란다에 화분 자리를 만들어 그 꽃씨를 심었다. 나팔꽃 순은 성큼성큼 자라 베란다 빨랫줄을 타면서 눈이 어릴 만큼 빛나는 꽃을 피웠다. 접시꽃만큼 큰 보랏빛 나팔꽃이었다. 한창 필 때면 하루에 스무 송이씩 피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가족은 제일 먼저 베란다로 나가 식전에 핀 나팔꽃을 세는 게 일과가 될 정도였다. 눈 뜨자마자 새로 피는 꽃과 만나는 일이란 여간 즐거운 일이 아니다. 그해 가을, 우리는 커피 잔으로 가득히 나팔꽃 씨를 받았다.
딸아이와 아내와 나는 봉투에 넣은 나팔꽃 씨를 각자의 학교로 가져가 친구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꽃 씨앗을 받는 사람치고 덤덤한 사람은 없다. 다들 큰 선물 이상의 고마움과 반가움과 기쁨을 표한다.
그런 기억 때문일까. 나는 일찍이 주말농장에 참여했고, 거기 한쪽 땅은 해바라기, 봉숭아, 코스모스를 심었다. 그 일을 나는 십 년이나 했다. 열 평 땅에 꽃이 아니라 상추만 심었다면 주말마다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닐 수 있었을까. 꽃에겐 별난 힘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