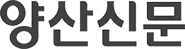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느 재가자의 공양청을 받았다. 부처님 당시에는 스님들이 탁발해서 공양[밥]을 얻어먹었다[현재도 미얀마ㆍ태국 등 남방불교에서는 승려들이 탁발함]. 혹은 불교신자가 부처님과 스님에게 점심 공양[식사]을 대접하는 경우도 있다. 신자가 공양청을 할 경우, 부처님께 미리 말해서 허락을 받는다. 그럼 그날 부처님과 제자들이 초대된 집으로 가서 공양을 한다. 마침 어느 신자가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겠다고 하였다.
부처님과 제자들이 그 집에 가서 점심공양을 마쳤다. 그런데 대체로 공양 후에는 부처님께서 초대된 집의 사람들과 마을 사람들에게 진리를 설하는 것이 관례인데, 그날은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계셨다. 그 무렵, 한 농부가 법문을 듣기 위해 헐레벌떡 뛰어 들어와 뒷자리에 앉았다. 실은 그 농부는 부처님의 설법을 듣기 위해 일찍 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황소가 우리를 뛰쳐나가 소를 찾기 위해 들판을 쏘다니느라 법문 장소에 늦게 온 것이다. 부처님께서 그 농부에게 '밥을 먹었냐?'고 물었고, 그 농부가 '먹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농부에게 '어서 저쪽으로 가서 밥을 먹고 오너라.'라고 말씀하셨다. 그 농부가 밥을 다 먹고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부처님께서 그제서야 진리를 설하셨다.
법문을 마치고, 한 제자가 물었다. '부처님께서 왜 아까 법을 설하지 않고, 그 농부가 밥 먹고 올 때까지 기다렸다고 진리를 설하셨습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는 황소를 찾느라 동분서주하느라 밥을 먹지 못했다. 내가 진리를 설할 때, 그가 법문을 듣다가 배고픔을 느낀다면, 그는 배고픔 때문에 진리를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래서 먼저 그의 배고픈 고통을 해결해 준 것이다. 그가 황소를 찾느라고 헤매었으니 얼마나 배가 고팠겠느냐?"
죽는 고통 중에 배고픔으로 죽는 고통이 가장 힘들다고 한다. 그래서 '잘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을 정도이다. 십여년 전에 읽은 『태백산맥』에서도 배고픈 고통에 대해 실감나게 표현한 구절이 있다. 필자도 30여년 전, 산에서 조난당해 굶어본 경험이 있어 배고픈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된다.
필자가 이 원고에서 하고픈 말은 부처님이 아니라 인간의 공감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싶어서다. 내 주위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먼저 경청한 뒤에 그 사람의 아픈 부분을 해결해주는 '예쁜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공감의식은 종교 테두리를 벗어나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인성'이라고 본다. 세상살이는 누구에게나 힘들다.
고달픈 삶의 길에서 서로를 위로해주는 공감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달픈데, 저 사람도 당연히 고달플 것'이라고 공감하는 그 마음 씀씀이를 가져보자. 부모와 자식ㆍ부부ㆍ동료 간에 공감을 갖고 상대를 이해한다면, 분쟁이나 다툼이 조금이나마 줄어들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