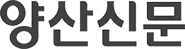그에게서 문자가 왔다.
'우리에게 언제쯤 마주할 기회가 주어질까. 그때까지 건강에 유의하기 바라네.'
보내준 노래 잘 들었다며 곡조도 좋지만 가사도 좋다고, 추워지는데 잘 지내라고 보낸 내 문자 메시지에 대한 대답이다.
그는 5년 전 대장암 수술을 받았다. 그 후 탈 없이 조심조심 지냈으니, 어느 정도 안심해도 좋은 때에 와 있다. 그는 고등학교 친구다. 그도 나처럼 남들보다 두어 살 많은 나이에 다녔으니, 어쩌면 그런 사정으로 서로의 마음이 깊이 닿아 있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도 그때뿐. 졸업과 동시에 나는 그 시절의 일을 까마득히 잊고 살았다.
그 후, 오래 다니던 직장도 물러났다. 그러고도 오랜 시간이 더 흐른 뒤의 어느 날이었다. 그에게서 문득 전화가 왔다. 그때가 그가 수술로 병상에 누워있던 때였다. 내가 몹시 생각나 수소문 끝에 전화번호를 알아냈다는 거다. 그 말을 듣고 나니, 그를 보러 가고 싶었다. 그러나 그때가 코로나19가 창궐하던 때였다. 그도 나도 목소리만으로 족해야 했다.
통화가 끝나고 그는 벚꽃 핀 교정에서 나와 둘이 찍은 흑백사진 한 장을 sns로 보내왔다. 그는 그 시절의 추억을 위태로운 병상으로까지 가져간 모양이었다.
그 얼마 뒤 퇴원했다는 문자 메시지가 왔다.
그는 강원도, 나로서는 한 번도 가 본 적 없는 태백에 살고 있었다. 몸이 조금씩 나아지면서 그도 사지에서 돌아온 사내들처럼 마음 비우기 연습을 하고 있었다. 늘 해 오던 대로 이웃사람들을 위한 잔일 봉사도 하며 나름대로 투병도 잘 해 나갔다.
생각해 보면 그 나이에 암으로부터의 귀환은 축복이었다.
만나지는 못해도 나는 그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싶었다. 어느 여름철인가 그는 나더러 한번 다녀가 달라고 종용했다. 태백이라는 곳이 얼마나 고지대인지 경험해 보라는 거였다. 한여름에도 이불을 덮고 자야 하는 곳이라 했다.
그렇지만 일상에 매여 사는 내가 여기서 먼 그곳까지 달려갈 여유가 없었다. 하지만 마음으론 일을 하다가도, 또는 밤에 잠자리에 들다가도 그를 생각한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그곳. 여름에도 이불을 덮고 잔다는 그 멀고 먼, 그리고 구름이 닿을락 말락 한다는 그 높고 아득한 땅 태백을 떠올린다. 제주도나 해외에 나가 잠깐씩 머물던 곳을 떠올릴 때도 있지만 그곳은 내가 가 본 곳이다. 그러나 그가 사는 태백은 내가 한 번도 가 본 적 없는, 요원한 미지의 땅이다.
그를 알고부터 내 생각은 가끔 그가 산다는 태백으로 날아간다.
그곳은 너무나 멀고 아득하고 골짝이 깊고 산이 높은 곳이다. 마치 문학작품 속의 어느 한 성스러운 곳 같은, 아니 한번 가보고 싶지만 갈 수 없는, 마치 메타버스나 가상의 세계 같은, 때로는 죽음 앞에서도 되살아나는 영원히 사는 별 같은 곳이다.
전화 속 너머에서 그는 가끔 말한다.
"겨울엔 밤이 길어 꿈이 많아지는 곳이네." 그때마다 그가 사는 곳은 이쪽과 너무도 다른 내 마음의 샹그릴라처럼 느껴진다.
이런 상상은 때로 나의 위안이 되기도 한다.
이 세상 어딘가에 여기와는 사뭇 다른 곳이 있다는 상상은 아름답다. 아득한 그곳엔 옛 시절의 추억을 소중하게 간직한 내 친구 그가 있다. 그의 태백을 오래 간직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