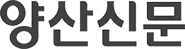대가를 치르지 않고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감은 추억까지 소환하게 하는 기억의 저장소
지금의 시간을 주워 담으며 골똘해지는 시월

시월의 사유
스치는 바람에서도 가을 냄새가 묻어나는 시월이다. 따사롭던 가을햇살이 이어지다가도 ‘찬 이슬이 맺힌다.’는 말뜻 그대로 한로(寒露)가 되자마자 며칠 사이 흐리고 바람이 불더니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기운마저 맴돈다. 들녘을 바라보면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초록색이던 벼 이삭이 금세 누렇게 변해 타작을 하는 모습에서도 가을의 정취가 물씬 풍겨지는 요즘이다.




작열하는 태양 아래 붉게 그 존재감을 발하던 배롱나무의 꽃도 마지막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듯하다. 어디 배롱 꽃뿐이겠는가, 떠나야 할 때를 알고 가는 꽃들의 모습은 처연히 자신의 삶을 덜어내고 있다. 반면, 갖가지 열매들은 곧 떨어질 날을 기다리면서도 오색향연의 절정을 이루며 그 속을 알뜰히 채워가고 있다.

마종기 시인의 [꽃의 이유]에서 ‘꽃이 지는 이유도 / 전에는 몰랐다 / 꽃이 질 적마다 나무 주위에는 / 잠에서 깨어나는 / 물 젖은 바람소리’라는 시구(詩句)는 지나간 과거를 붙잡지 않고, 지금 여기에 집중하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삶의 자세가 투영되어 있는 듯 느껴진다. 자연의 모습도 그러하다.
뉴스를 볼 때면 식상한 소식 중 하나가 “oo가 금값이다.”는 표현이다. 주로 농축산물에 많이 적용시키는 표현인데, 지난 추석에도 과일 가격이 올랐다고 “천정부지로 치솟았다.”며 미디어가 나서서 호들갑이었다. 오를 수밖에 없지 않은가? 봄철 서리에 이어 여름철 폭염과 길었던 장마에 폭우, 태풍 등 기상 악화가 수확량을 감소시켰으니 비싼 과일값은 소비자 뿐 아니라 상인들 역시 마진율이 떨어지면서 걱정은 매한가지겠다. 누가 자연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을 알아주기라도 하겠는가, 인고의 시간을 견디어 탐스러운 과일을 생산해내는 그들의 노고를 알아주겠는가 말이다.
시골 태생으로 논밭곡식과 수박, 토마토 같은 과일에 소, 돼지, 닭을 사육했던 집의 자손인 나는 도시 사람들이 자연에서 생산해내는 갖가지 것들의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면 화가 나기까지 했다. 옷이나 전자제품, 자동차 등은 오히려 비쌀수록 없어서 못 팔 만치 수요가 많음에도 자신들의 입으로 들어가 바로 영양분이 되는 것들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 가격만을 운운하며 가치 비중을 두지 않는 모습이 이해가 되질 않았다.
특히 과일은 그 자체로 식용 뿐 아니라 약용의 가치로도 효용성이 높은 식품인데 조금의 시세 변동에도 민감하기까지 하다. 꽃에서부터 열매에 이르기까지 과수(果樹)의 커가는 과정을 조금이라도 알게 되면 단순히 가격으로만 책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기철 시인의 [시월의 사유]에서 ‘단맛으로 방을 채운 열매들이 / 무거워진 몸을 끌고 땅으로 돌아온다 / 내년을 흔들며 떨어지는 잎새들’ (중략) ‘익는 것이 전부인 시월 / 시월은 시월의 생각만으로 골똘하다 / 나뭇잎은 생을 펄펄 날리고 / 사람들은 가슴마다 생을 주어 담는다.’라는 시구(詩句)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만 같다. 세상에 공짜는 없음이다.



기억의 저장소
어릴 적 마당의 동, 서쪽에는 큰 감나무 두 그루가 있어 새들과 곤충들이 항상 드나들었고, 서쪽의 감나무 아래로는 부엌에서 쓸 땔감을 쌓아둔 나무더미가 가득했는데 주로 이곳에서 나의 회초리가 제공되어졌다. 어려서부터 장난꾸러기라 혼날 일이 많았는데 이 앞에서 울먹거렸던 그때의 기억들이 지금은 웃음을 자아낸다.
중학생 될 무렵 우리 집은 한옥에서 양옥으로 바뀌었고, 공사와 함께 없어진 감나무 자리에 새로운 단감나무가 심어졌다. 세월 먹고 훌쩍 자란 그 단감나무는 땡볕을 막아주는 그늘막이 되어왔고, 여름이면 아이들의 물놀이터로도 변신을 하며 아이들에게는 또 다른 추억의 장소로 기억될 것이다.


예로부터 밭둑에 대추나무, 야산자락에 밤나무, 집 마당가에 감나무, 숲속에 배나무를 심었다 한다. 조상을 모시는 차례나 제사상의 맨 앞줄에 오르는 조율이시(棗栗梨枾)가 현세 사람들의 삶 주변에 자리하고 있다. 이 중 감나무는 웬만한 집에는 거의 있을 정도로 흔한 나무였다.




‘감꽃은 장난감의 / 황금 목걸이 / 실에 꿰어 목에 거는 / 자랑 목걸이’ 이주홍 시인의 [감꽃]이나 ‘감꽃 줍는 애들 곁에서 / 하나 둘 나도 감꽃을 주우면서 / 금목걸이를 목에 두를까 / 금팔찌를 두를까’ 송수권 시인의 [감꽃]에서처럼 나의 어린 시절에도 봄에는 감꽃을 주워 실에 꿰서 목걸이, 왕관, 팔찌를 만들며 놀았다.


간식이 흔하지 않던 당시의 초여름에는 떨어진 푸른 땡감(풋감)을 소금물 담근 장독에 넣어 며칠간 묵혀뒀다가 꺼내먹기도 했다. 물컹하면서 소금기 배어 짭조름한 그 맛을 아직도 기억한다. 부모님 세대의 사람들이 어렸을 때는 학교를 오가며 모내기 한 논가의 땅에 풋감을 묻어두고 며칠 지나 꺼내 먹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나무가 단단하지 않아 잘 부러지는 가지를 살금살금 타고 올라가 매미를 잡던 여름날의 추억도 생생하다. 가을에는 붉은 색이 맴돌 무렵 깎아서 처마 밑에 줄줄이 매달아두면 갈바람과 따뜻한 볕이 감을 쫄깃하게 말려 하얀 분이 필 때쯤 달콤한 곶감으로 변한다. 요즘말로 하면 ‘겉바속촉’이라 해야 할까? 완전히 곶감이 되기 전, 겉은 말라서 약간 질긴 듯 하면서도 속은 말랑말랑한 그 느낌을 나는 좋아했다. 곶감은 감을 깎고 말리던 할머니를 연상하게 하기에 충분하다. 외가에서 보내온 창감은 두고두고 묵혀 홍시가 되면 초겨울까지 탱글탱글한 식감과 천연 달달함이 입 안 가득 차오르는 즐거움을 주었다.
집집마다 붉게 익어 주렁주렁 달린 풍경은 가을을 감의 계절이라 해도 손색없게 만든다. 감은 그냥 과실이 아니라 옛 추억까지 소환하게 하는 기억의 저장소이다.


오상칠절(五常七絶)의 나무
감나무 이름의 유래는 보통 ‘감(甘)+나무’로 알고 있지만, ‘감’은 ‘갇’이 변한 ‘갈’에서 유래된 말이다. ‘갈’은 일본어에도 영향을 주어 ‘카키(kaki/柿の木)’가 되었고, 학명(Diospyros kaki Thunb)에도 kaki로 쓰인다. 고어가 많이 남아 있는 제주도에서는 감물 들인 의복을 ‘갈옷’이라 하였단다.



전통적으로 감나무를 오상칠절(五常七絶)의 나무로 칭송했다. 유교에서 사람으로서 지켜야 하는 다섯 가지의 윤리인 오륜(五輪/父子有親, 君臣有義, 夫婦有別, 長幼有序, 朋友有信)이 있듯, 감나무에는 오상(五常)이 있는데, 넓은 감잎은 잘 말려 종이 대신 글을 쓸 수 있어 문(文), 부드럽지만 탄력 있는 목재는 화살과 같은 무기를 만들 수 있어 무(武),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모두 붉어 충(忠), 홍시는 달고 부드러워 이가 없는 노인도 먹을 수 있으니 효(孝), 바람과 눈서리 날리는 추운 날에도 열매가 매달려있으므로 절(節)이 있다는 것이다. 칠절(七絶)은 오래 살고, 그늘이 좋으며, 새가 집을 짓지 않고, 벌레가 들지 않으며, 단풍이 아름답고, 열매 맛이 좋으며, 낙엽은 거름으로 유용하게 쓰여 좋다는 일곱 가지를 의미한단다.
신록의 계절에 황백색으로 피어나는 감꽃은 대체로 수꽃과 암꽃이 다른 나무에서 피는데 드물게는 한 나무에서 피는 것도 있다 한다. 열매가 달리는 꽃은 암꽃 또는 양성 꽃으로 보기도 한다는데 수술이 있기는 하나 퇴화되어 제 구실을 못하는데도 열매가 잘 달린다. 꽃이 수정되지 않아도 씨방이 발달하여 열매가 생기는 단위결실(單爲結實)의 나무이기 때문이다.


사과 같은 열매는 꽃받침이 자라서 과실이 된 것으로 꽃받침은 꽃이 지고 나서 열매가 맺히면 열매꼭지가 되는 반면, 감은 씨방이 열매가 된 것이다. 열매의 자루에 꼭지가 있으면 씨방이 변해서 과육이 된 것으로 감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딱딱한 감 씨를 쪼개어보면 그 안에 흰색 숟가락 모양의 배가 있다. 감 씨는 배젖인 셈이다.


잎사귀는 둥글넓적하고 매끈하며 화려하지는 않지만 가을 되면 노랗고 붉게 물든다. 또 잎에는 열매 못지않게 비타민C가 풍부하여 차로 만들어 마시기도 한다. 감나무에 벌레가 잘 들지 않는 것은 떫은맛을 내는 타닌(tannin) 성분이 섬유질을 단단하게 만들기 때문인데 풋감 때 감물을 만들어 방습제, 방부제, 염료로도 사용한다. 과육이 딱딱할 때 타닌 성분이 많지만, 점점 익어가면서 타닌이 제거되고 말랑말랑해지며 단맛이 나는 것이라 한다. 사람도 이와 같을까 생각해보게 된다.


유독 맛이 좋은 외가의 창감 홍시가 생각나서 외삼촌께 전화를 드려봤더니 올해는 해거리를 해서 열매가 많이 없는데다가 누군가 다 따서 가져가버렸단다. 때마침, 씨 없는 청도 반시를 선물로 받았다. 달콤함을 맛보며 기억의 저장소를 돌려본다. 어수선한 세상사에 달콤했던 예전도 추억하며 지금의 시간을 주워 담는다. 이런저런 생각으로 골똘해지는 시월이다. 田


전이섭 ‘문화교육연구소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