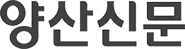고령화라는 말도 익숙해졌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는 소식도 낯설지 않다.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고 있다는 말인데, 사실 이 문제는 저 출산의 문제만큼 심각하다. 4차 산업 시대를 목전에 둔 지금, 노인 혐오라는 말까지 심심찮게 들리니 더 우울해진다. 이대로 가면 인공지능로봇이 노인을 돌보는 때가 도래할지도 모른다. 과연 따스한 인정을 느낄 수 있을까? 우려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예감에 가슴이 묵직하게 내려앉는다.
인류 역사를 자본주의로 나누어 보면, 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최소한 인간 존중 사상이 있었다. 인간을 중심에 두었던 당시, 존중 대상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었다. 그것도 나이가 많은 어른. 중요한 의례인 장례를 떠올려보아도 쉽게 이해된다. 마을에서 어른이 돌아가시면 고인은 그분이 머물던 방안에 모셨고, 마을사람들은 그분이 생전에 했던 일을 떠올리며, 함께 고마워하고 슬퍼했다. 그러나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장례는 병원의 가장 후미진 곳에서 치러진다. 문상객은 형식적인 인사를 나누고선 일상으로 바삐 돌아가고, 가족들은 손님을 접대하느라 슬퍼할 시간도 없다. 고인의 시체는 일종의 쓰레기처럼 소각되거나 ‘처리’되고, 한 인생은 한 장의 수표로 남게 된다. 그리고는 금방 잊히고 만다.
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인을 존중한 이유는 그분들의 경험 때문이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생활 패턴이 거의 동일했던 시대에 어른들은 몸으로 직감한다. 밭은 언제 갈고, 언제쯤 씨를 뿌려야하는지, 그 경험은 곧 지식이었다. 어른들은 참꽃과 진달래꽃의 차이를 알고, 독버섯과 참버섯의 차이를 안다. 심지어 언제 이사를 해야 할지도 알고 있다. 예전에 마을 어른들은 집 마당에 구리(구렁이=뱀)가 나타나면 이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집안 구석에서 쥐를 잡아먹으며 병균이 퍼지지 않게 도왔던 구렁이가 제 자리를 벗어나 장독대로 나올 때는 생존의 위기를 느꼈다는 뜻. 이사는 그래서 해야 한다는 어른들의 이야기다. 그러니까 그 시절 노인을 돌보는 것은 생존을 위한 일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후기 자본주의에서 나이든 어른은 쓸모없는 존재로 취급된다. 이 사회에서 인간의 쓸모를 규정하는 것은 최신 제품이기 때문이다. 최신 제품을 다루지 못하면 낡은 사람이고, 낡은 것은 폐기처분의 대상이 된다. 나도 어느덧 낡았다. 컴퓨터가 고장 나면 아들에게 물어봐야 한다. 스마트폰은 설명서를 읽어도 독해가 되지 않는다. 최신 기기로 바꾸어도 활용할 수 없으니 최신이란 말은 의미가 없다. 나뿐 아니라, 노인은 신제품을 다룰 줄 모른다. 새로운 제품을 다루려면 여러 번 반복해야 하지만, 익숙할만하면 그 사이 새로운 제품이 나오니 계속 소외될 수밖에 없다. 노인은 존경받지 못할 뿐 아니라 불필요하고 무용한 존재로 인식된다.
그러나 과연 그런가? 조선조의 효를 강조하려는 건 아니다. 존중을 강요해선 안 된다. 지금은 조선시대가 아니고, 존중을 강요해서는 젊은이들과 섞일 수 없다. 우리는 각자 앞에 놓인 삶의 조건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그것은 실존의 문제다. 후기 자본주의에서 경험은 중요하지 않다. 노인은 젊은이의 조건을 이해하려 애써야 하고, 젊은이 역시 노인의 인간적 삶과 그 역사를 이해하려 해야 한다.
자본을 등에 업은 기술문명은 인간 소외와 정보 단절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여기에 편승하여 늙음을 비하하거나 젊은이에게 언어의 비수를 던지면, 그것은 언젠가 자신의 가슴에 천검(天劍)처럼 날아가 박힐 것이다. 젊은이와 노인이 서로 교감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생로병사하는 사람(人) 사이(間), 생이란 의외로 짧다. 그 외로움, 고독의 자리는 곧 나의 자리가 될 거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