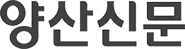대학이 많기도 너무 많고 흔해 빠지기도 너무 많이 흔해 빠졌다. 그러고 보니 대학교수도 너무 많이 흔해 빠져서 양식(良識)과 질이 문제가 되는 수가 많다.
해방 후, 배움에 굶주린 부모 세대가 밥을 굶으면서도 자식들을 학교에 보내는 일에 열성이었다. 일제 때 조선 사람들 사이엔 민족독립의 지름길은 교육에 있다. 배워야 산다는 구호가 유행이었다. 우리 백성이 너무 우매해서 나라를 빼앗겼다는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너도나도 자식교육에 총력을 기울였던 것이다.
따라서 국민교육의 기본이 되는 보통교육기관의 수요가 급증을 했다. 6.25전쟁의 총성이 멎고 숨을 돌리자 중등교육의 수요가 또한 폭증을 했다. 이어서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이 전국 곳곳에 우후죽순처럼 난립하기 시작을 한 것이다. 여기에 공업화 산업화의 분수령이었던 7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전국 도처에 각종 기능전문대학들이 앞을 다투어 설립되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난 강의 수요를 메꾸기 위한 '교수기근'이 심화되었다.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른 것이다.
각 대학들은 수요에 따른 전공분야별 석박사과정을 서둘러 신설하거나 학과별 정원수를 늘렸다. 수요가 많은 학과의 전공인력을 늘려서 석박사를 양산, 교수기근을 충당하기 위한 응급조치였던 것이다. 젊은 직장인들의 야간대학원 등록수요도 급증하는 현상을 보였다.
이때에 중등교직자들의 대학으로의 이동이 봇물이 터지듯 급물살을 탔었는데, 이런 현상은 해방직후, 휴전이후, 5.16후 60년대 이후에도 간헐적으로 있었던 일이다.
특히 해방 후, 일본인 교수들의 빈자리를 채우는 과정에서 전공요건을 갖춘 교수자격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현상이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전쟁으로 사회 각 분야의 고급인력의 결원 공백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었다. 대학 강단도 예외일 수 없었다. 전쟁으로 인한 위기는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이후, 학문사대(學問事大) 숭미(崇美)주의자들의 대거 대학 강단 등장은 절대적으로 대학의 위기를 불러 온 것이다.
대학의 위기는 곧 학문의 위기, 지식의 변질, 진리의 왜곡으로 이어지고, 상아탑문화의 저질화 진리의 전당의 세속화, 신성한 학문탐구의 타락화를 부르게 되었다.
획일적이고 저돌적인 군사문화가 추구한 공업화 산업화의 바람을 타고, 한발 앞서 공업화 산업화에 성공한 아메리카의 저급한 상업자본주의에 정신이 팔린, 미국유학파의 대학 강단 점령은 절대적은 대학정신의 황폐화 고전적 의미의 아카데미즘의 몰락을 자초하고 말았던 것이다.
인간으로서의 기본이 안 된 인격체들이 허울 좋은 미국유학 간판을 번쩍이는 훈장처럼 내세우고 어중이떠중이 할 것 없이 대학 강단으로 몰려들었다. 일본천왕의 은혜를 입어 잘 먹고 잘살던 친일 매국노들의 후예와 미국선교사나 주한미군들과 친교가 있거나 인맥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여기에 이른바 '유신장학생'으로 통하는 군사팟쇼정권이 키운 '엑비 밀정'들도 대를 이어서 계속 많은 고급인력이 배출되었다.
이런 과도기적 기현상은 똥 대학이라도 미국 가서 박사학위만 따오면 대학교수가 될 수 있다는 유행어를 만들어냈다.
미국선교사가 설립한 서울의 모 대학에서 명색이 대학교수라는 사람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매춘부로 매도하는 망언을 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이런 친일 친미 반민족 매국세력이 그물망처럼 촘촘한 조직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미군 주둔 74년, 한일협정체결 54년, 이 긴긴 세월동안 우리도 모르는 사이 겉모습만 그대로이고 속혼 민족의 얼 넋은 모두 통째로 미국화 일본화가 다 되어 버린 느낌인 것이다.